-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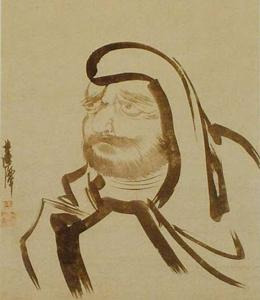
조선 중기 미술의 특징과 발전
조선 중기(1550~1700년경)는 정치적으로 사색당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등 대란이 이어진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혼란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선 중기 미술은 오히려 크게 발전하여 독특한 양상을 띠며 한국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중기 회화의 전반적 특징
조선 중기 회화는 조선 초기에 형성된 화풍들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절충과 변화를 통해 그 시대 특유의 화풍을 형성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천을 주제로 사실적으로 그리는 실경 산수화의 전통을 더욱 굳히고, 국가적 행사의 장면을 산수를 배경으로 묘사하는 기록화가 발전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명나라로부터 남종화풍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다음 시대인 조선 후기로 이어져 새로운 민족적 화풍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조선 중기에는 우리나라 회화사상 어느 시대보다도 묵법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달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주요 화풍과 화가들
안견파 화풍의 계승
사실상 중기의 화가들은 안견파 화풍을 비롯한 조선 초기의 회화 전통에 집착하는 경향이 현저했습니다. 이정근의 <설경산수도>, 이흥효의 <산수도>, 나옹 이정의 <산수도>, 이징의 <이금산수도>와 <고사한거> 등의 작품에서 안견파의 전통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들은 새로운 화풍을 받아들이면서도 전통의 토대 위에서 수용했습니다.
절파 화풍의 유행
조선 초기 15세기에 강희안에 의해 일부 수용되었던 절파 화풍이 16세기에 이르러 적극적으로 유행했습니다. 김시의 <동자견려도>, 이경윤의 <고사탁족도>와 <산수인물도> 등의 선비화가들에 의해 추구되었으며, 뒤에 김명국과 같은 뛰어난 화원들이 이를 바탕으로 강한 필치의 화풍을 이루었습니다.
김시의 <동자견려도>는 절파 계통의 화풍으로 그려진 그림으로, 비스듬하게 솟아있는 주산, 산의 표현이 흑백 대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붓질이 매우 거칠고, 산수보다 인물과 동물에 비중을 많이 둔 이 그림은 대표적인 절파계 그림입니다.
조선 중기의 절파계 산수화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동자견려도>처럼 아직은 배경이 산수를 크게 다룬 대관산수이고, 다른 하나는 인물과 동물이 중심이 되고 배경의 산수는 작게 그리는 소경산수(또는 소경산수인물도)입니다.
영모화와 화조화의 발달
조선 중기의 회화에서 크게 주목되는 것은 조선 왕조적인 정취를 짙게 풍겨주는 영모와 화조화가 발달했다는 사실입니다. 달무리진 눈매와 퉁퉁한 몸매를 보여주는 김식의 소 그림인 <우도>, 애잔한 느낌을 자아내는 조속과 지운 부자의 수묵 화조화 <노수서작도>와 <매상숙조도> 등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묵죽, 묵매, 묵포도의 발전
조선 중기에는 문인들의 지조와 절개, 인품을 상징하는 묵죽, 묵매, 묵포도 등을 그린 그림이 유행했습니다. 탄은 이정의 <묵죽>과 <풍죽>, 어몽룡의 <월매도>, 황집중의 <묵포도도> 등에서 한국화 현상이 현저히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는 문인화가들이 한 가지 분야에 몰두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시대적 배경과 주제의 특징
조선 중기는 전란과 사림의 당쟁으로 문인들이 삶에 불안과 회의를 느끼게 되었고, 관직을 떠나 자연에 은거하는 삶을 꿈꾸었습니다. 따라서 은일사상과 관련 깊은 탁족, 어초문답, 고사한담과 같은 주제의 산수인물화들이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산수인물화에서 은둔사상과 연관이 깊은 어초문답, 어부, 탁족, 관폭, 조어 등의 주제들이 자주 다루어진 점이나 선비의 절의를 상징하는 대나무와 매화가 선비화가들의 묵화에서 빈번하게 그려진 것도 치열한 사색당쟁, 참혹한 왜란과 호란 등으로 점철된 어지럽던 중기의 시대상을 대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가 집안의 등장
조선 중기에는 화가 집안들이 여럿 생겼다는 점도 괄목할 만합니다. 김시-김기-김식-김토집 집안, 이경윤-이영윤-이정-이징 집안, 윤의립-윤정립 집안 등의 선비화가 집안들을 비롯하여 이숭효-이흥효-이정 집안, 이명수-이정근-이정식-이홍규-이기룡 집안 등의 화원 집안들이 생겨났습니다.
왕족 출신 화가들의 활약
조선 초기의 특이한 현상 중 하나인 왕족 직계 후손 출신 예술가들의 등장은 중기에도 이어졌습니다. 세종의 증증손인 이암(1507-1566)과 이정(1541-1622), 성종의 아홉 번째 아들인 이성군의 증손자인 이경윤(1545-1611), 이경윤의 서자인 이징(1581-1645년 이후)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조직화된 그룹을 형성하지 않았고, 특정 장르나 화풍을 공유하지도 않았으며, 각자 그 시대 예술에 독특한 기여를 했습니다.
조선 중기 미술의 의의
조선 중기 미술은 정치적 혼란과 보수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조선 초기 회화의 전통을 잇고 새로운 화풍을 가미하면서 조선 중기 특유의 양식을 발달시켰습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한국적 화풍은 후대 조선 후기 미술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중기에 들어오기 시작한 남종화풍은 적극적으로 유행하지는 못했지만, 후기에 이르러 진경산수화와 함께 조선 회화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또한 중기에 발달한 실경산수화와 기록화의 전통은 후기에 더욱 발전하여 한국 미술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조선 중기 미술은 중국 미술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독자적인 한국적 화풍을 형성했으며, 이는 한국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정치적으로 혼란했던 시기였지만, 예술적으로는 오히려 풍요로운 성과를 이룩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술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양 미술사: 조선 후기 미술 - 변화와 혁신의 시대 (0) 2025.03.30 [동양 미술사 탐구] 달마도 (0) 2025.03.30 [동양 미술사 탐구] 조선 초기 화단의 거장, 안견 (0) 2025.03.29 동양 미술사 : 조선 초기 미술 (0) 2025.03.29 [동양 미술사 탐구] 명나라 미술을 이끈 명사가(明四家)의 삶과 예술 (0) 2025.03.29
ideas-7708 님의 블로그
미술사
